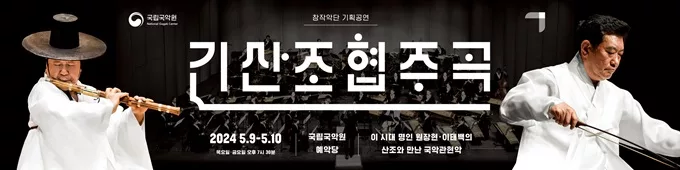어느덧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에 치이느라 정신이 없던, 나. 바빴던 나날을 잠시 내려놓고 문득 되돌아보니, 오늘따라 더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한다는 그 한 마디도 제대로 못해서 늘 미안한, 우리 가족.

“뭔가 혼자 살다보니까 외롭고 지칠 때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은거 같아요.”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아유, 지금은 손녀가 바빠서… 자기도 직장생활 하느라고.”

“오늘 할머니랑 같이 사진 찍으러 왔는데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같이 사진 찍자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 자라고 나서 할머니랑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좀 설레고…”

양평에 있는 우리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매일 다니셨던 이 길을 걷습니다.

이곳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던 곳.

우리 할머니의 공간, 우리 할머니의 냄새,

그리고 언제나 손녀만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할머니는 혼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할머니의 공간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손녀가 사드린 생일 선물은 어느덧 할머니의 보물이 되어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순간의 내가 살고 있었던 걸까요.

“응, 이제 정리해서 가려고.”

“늦었네. 밥 먹어.”
“회사 생활은 힘들지 않니?”
“아이구, 옷 정리 좀 하고 다니지.”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던 사람. 나의 하루를 걱정해주던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할머니. 우리 할머니. 보고싶은 할머니.
“우리 할머니 원래 더 예쁜데… 사진 많이 찍어줄 걸… 할머니 미안해… 내가 많이 미안해…”

“감사합니다.”

“사진관 총각, 나 사진 한 장만 더 찍어줄 수 있을까?”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