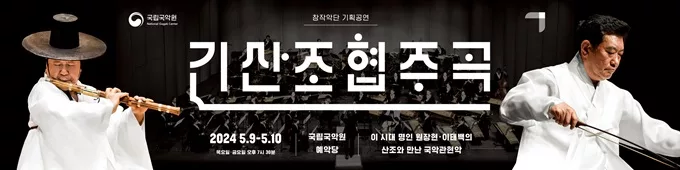“사람은 주량을 말할 때 항상 겸손해야 한다
언제 어디에 러시아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주 주량을 자랑해도 불곰국 러시아 형님들 앞에서는 ‘주스 좋아하는 어린애’가 될 수 있다.
‘400km가 아니면 먼 거리가 아니고, 영하 40도 밑이 아니면 추운 날씨가 아니며, 알콜도수 40도 아래는 술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그들은 극단적 환경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자란 알콜 파이터다.
동유럽, 그중에서도 러시아의 역사에서 보드카는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민심은 보드카로 움직였고, 세금도 보드카로 걷을 수 있었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는 보드카가 화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오늘 마시즘은 러시아의 보드카 이야기다. 대체 이 형님들 얼마나 마신 거야?
이시도르 수도사
보드카의 탄생… 아마도

보드카(Vodka)는 어디에서 탄생되었을까? 이는 보드카 벨트, 동유럽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기록을 따져보면 1405년 폴란드 법원 재판기록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12, 13세기경부터 러시아에서 마셨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는 이가 있을 정도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 알콜적인 느낌에 가까운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는 언제 보드카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1430년대, 이시도르(Isidore)라는 괴짜 수도사는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방법 외에도 증류 기술을 익혔다. 하지만 러시아에 돌아온 이시도르는 성직자가 되지 못하고 수도원 감옥에 갇힌다.
그리고 그곳에서 몰래 보드카를 증류하기 시작하고, 1441년 간부들을 취하게 만든 후 탈출한다. 하지만 이시도르가 감옥에 남겨놓은 증류기 덕분에 러시아에서 보드카가 전파되었다는 전설이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보드카의 원조라는 힘을 얻기 위한 스토리텔링에 가깝다. 이탈리아에서 증류 기술을 배워왔다는 것은 OK. 감옥에서 밀주를 만들기도 하니 그것도 OK다. 하지만 담금주가 아닌 증류주를 만들었다니.
강철의 연금술사도 하기 힘든 일을 러시아 감옥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다른 증류주들처럼 약용으로 쓰이다가 마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술안주로 좋으니까.
표트르 대제
감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러시아에게 있어도, 보드카에게 있어도 표트르 대제(Peter the Great)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가 있기 이전의 러시아는 발전이 없는 추운 땅덩어리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였다.
표트르 대제는 유럽 전역을 돌며 고국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오고 들여왔다. 금융, 언론, 사법분리, 경찰, 사관학교, 조선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그중에 제일은 ‘감자’를 들여온 것이다.
그는 ‘감자’야 말로 배 굶고 사는 러시아 국민을 위한 농작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농민들은 독이 들었다고 먹지 않았다. 표트르 대제가 그들 앞에서 즉석 먹방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러자 표트르 대제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불렸다. 러시아의 감자 보급화는 훗날의 이야기다(결국 돈 주니까 먹었다). 하지만 표트르 대제의 감자 도입으로 러시아의 보드카는 곡물 대신 감자가 베이스가 되어 증류하게 되었다고.
표트르 대제는 해양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다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만 했다. 전쟁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감자… 아니 국민들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 보드카는 잘 마시잖아? 표트르는 보드카 생산을 국가에서 독점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드카를 팔았다. 공짜로 마시고 싶으면 입대를 해야 했다고.
블라디미르 스미노프
보드카의 세계화… 아니 방출화?

알콜계의 꿈나무(?) 마시즘이 아는 몇 안 되는 보드카 중에는 스미노프(Smirnoff)가 있다. 1864년, 표토르 스미노프(Pyotr Smirnov)가 만든 자기 이름을 건 보드카다.
스미노프는 사실 러시아의 황실에 납품을 하던 보드카였다. 납품을 하다가 공장까지 납품해버린 것이 함정이지만.
스미노프가 스미노프를 만들던(?) 시절은 국가 전매제가 해제된 시기였다. 하지만 1904년 제정 러시아에서 다시 보드카를 국가에서 제작하기로 결정하며 스미노프 일가는 공장과 브랜드를 빼앗긴다. 뒤이어 1917년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다.
돈도, 공장도, 명예도 빼앗긴 아들 블라디미르 스미노프(Vladimir Smirnov)는 목숨까지 위협당한다. ‘탈 러시아가 답이다’ 스미노프 일가는 목숨을 건 망명을 한다.

(러시아 황실에 납품했다는 스미노프 NO.21)
블라디미르 스미노프는 터키에 자리 잡아 보드카 사업을 한다. 물론 망한다. 불가리아에서도 망했고, 핀란드에서도 망했다. 파리에서는 스미노프라는 이름을 러시아 식인 ‘Smirnov’에서 프랑스 식인 ‘Smirnoff’로 바꾼다.
물론 망했다. 1933년 루톨프 쿠네트(Rudolph Kunett)에게 북미 사업권을 넘기고 미국에 진출한다(이때도 일단은 망하고 시작한다).
비록 실패에 실패를 겪으며 커나갔지만 러시아 보드카를 세계적으로 넓히는데 큰 공헌을 한다. 또한 오늘날 여러 칵테일의 베이스가 보드카가 되는데 일조를 하기도.
이오시프 스탈린
목숨을 건 보드카 야자타임

스탈린은 인민들에게 보드카를 쥐어준 인물이다. 한편으로는 보드카를 팔아 재정을 보태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혹독한 추위와 공포를 보드카로 잊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1940년대에 들어서는 고기, 채소를 파는 가게를 합친 것보다 술을 파는 가게가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스탈린과의 술자리다. 그는 부하들과 술자리에서 보드카를 권유하기로 유명했다. 그리고 술에 만취한 부하들의 진심을 파악하였다는데. 아시다시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장의 이슬행이 되었다고 한다.
술자리의 공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1942년 처칠은 스탈린을 만나 2차 세계대전 문제를 논의하며 보드카를 나눴다고 한다. 이때 처칠은 보드카 대신 비교적 도수가 약한 와인으로 바꿔서 스탈린과 건배 게임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측의 기록에서는 스탈린이 보드카를 반잔만 마시고, 반 잔은 물로 채워 넣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다(루스벨트 참모피셜). 밑장 빼기의 연속. 결국 이 형님들은 호방한 척은 다하고, 속으로는 취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구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월드와이드 음주가무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보드카의 위상은 꺾이지 않았다. 그 위상을 보여준 것이 보리스 엘친(Boris yeltsin)이다.
스탈린이 목숨이 날아갈까 봐 함께하기 싫은 술친구라면, 보리스 옐친은 주사가 너무 심해 함께하기 힘든 대통령이었다. 문제는 그가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보리술… 아니 보리스 옐친의 음주사고는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다. 1994년에는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이 있어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는데, 가는 도중에 너무 과음을 해서 비행기에 내리지 못한 전력이 있다.

(마에스트로, 다섯살 때부터 난 음주를 했어 영재였지~)
같은 해 8월에는 독일에 방문해 국빈 방문 오찬에서 러시아 민요가 연주되자 지휘자의 지휘봉을 빼앗아 지휘를 했다. 문제는 독일 텔레비전에 이 장면이 생방송이 되었다는 것.
1995년에는 백악관에서 술을 마시고 뻗었다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백악관 입구까지 걸어간 적도 있다. 이유를 물으니 “피자를 시키러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의 음주 기행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국가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러시아인들은 이 막장스러운 행동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뭐, 보드카 좀 마시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러시아의 변화
이제, 드디어, 참트루 술에서 깨는 거야?
‘러시아에서는 치매에 걸릴 일이 없다. 그전에 술병으로 죽으니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음주량과 사망률은 심각한 문제다(남녀의 평균수명 차이가 12살이 난다, 영감아 술 좀 그만!).
2009년에는 반 알콜 캠페인을 벌이는 등 5년 사이에 술 소비량이 30%나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여전히 치명적으로 많이 마신다.
하지만 러시아의 역사보다 보드카의 음주사가 더욱 길다. 1648년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키자 보드카 무한리필 파티로 민심을 잠재웠다느니, 1725년 예카테리나 여제가 보드카를 남자보다 잘 마셔서 인정을 했다느니 등의 전설들은 술자리를 타고 흐른다.
이야기가 즐거운 만큼, 취기도 깊어진다. 러시아는 과연 ‘적당히 마신다’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