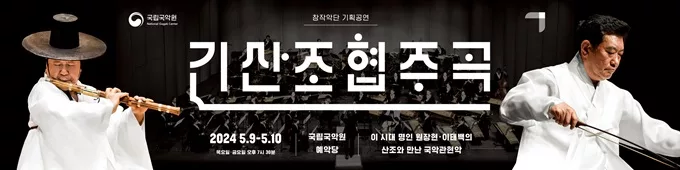“내가 마신 오렌지주스는 오렌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귤주스였다”
인생의 첫 배신감. 그것은 오렌지주스를 처음 마셨을 때다. 글을 몰랐던 꼬마 시절 나는 그동안 마시던 노란 주스가 오렌지주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귀중한 손님이 집에 오기 전 까지는. 엄마가 냉장고 깊숙이 숨긴 델몬트를 꺼내기 전까지는. 그리고 잔에 남아있는 오렌지주스를 몰래 마셔보기 전까지는.
오렌지주스의 첫 모금이 기억난다. 물론 귤과 오렌지를 구분하지 못할 시절이었지만, 시큼함의 깊이가 달랐다. 하지만 마셔보기 전까지는 이것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기에… 병에 그려진 그림(로고)을 기억했다.
다음에는 꼭 이걸 사달라고 해야지. 이걸 꼭 마셔야지… 오렌지주스는 너란 녀석은 언제 나타난 것이니?
오렌지주스의 역사는 짧다?
전쟁 속에 태어난 오렌지주스

단 것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이라면, 시큼한 것을 찾는 것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다. 오랜 기간 항해를 하던 18세기, 많은 선원들은 정체불명의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병의 원인은 비타민C 부족. 1747년 군의관 제임스 린드가 ‘레몬’을 처방하자 병을 막을 수 있었다. 문제는 선원, 군인 등 장기 행군을 하는 이들에게 레몬이 신물 날 정도로 공급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레몬을 먹을 수 없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오렌지주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과즙을 짜서 마시는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유통이 가능한 음료를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갓 짜낸 오렌지즙은 농장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색깔과 맛이 변해버렸다.
하지만 과학이 승리했다. 파스퇴르가 개발한 살균법, 그리고 냉장고의 보급으로 오렌지주스를 멀리까지 유통하는 게 가능해졌다. 1940년대 캘리포니아 농부들은 오렌지즙을 살균하고 농축하여 상하지 않는 오렌지 음료를 하나 둘 개발했다. 바로 오렌지주스(냉동 농축 오렌지주스)의 탄생이다.
환타와 써니텐부터 썬키스트까지
오렌지란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오렌지주스가 대한민국 땅을 밟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애초에 오렌지도 낯선 과일이었다. 한국음료계에서 오렌지주스란 분말형태로 만들어진 파우더 정도였다. 1968년 ‘환타’가 내한하기 전까지는. 단지 오렌지향을 첨가했을 뿐인데 환타의 인기는 대단했다. 1976년에는 오렌지 과즙을 무려 10%나 함유한 써니텐이 나왔고, 1980년에는 오렌지 과립이 들어간 쌕쌕 오렌지가 나왔다. 와 이쯤 되면 정말 오렌지 아니냐?

아니다. 단지 오렌지 10%에 설레었던 우리들에게 오렌지 100이라는 숫자를 단 오렌지주스가 나타났다. 해태음료에서 ‘썬키스트’의 상표를 받아 오렌지주스를 출시한 것이다. 당시는 과일 흉내만 내도 주스였는데, 썬키스트의 등장으로 주스계에는 신분제도가 생겼다. 심지어 ‘무가당’. 당을 따로 넣지 않았다니. 읽기만 해도 건강한 느낌이 들었다.
오렌지주스는 방문판매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야쿠르트 아줌마처럼 썬키스트 아줌마가 있었다. 요즘에야 추억하는 오렌지주스 유리병은 방판을 통해서 보급된 것이다. 하지만 오렌지주스를 마트나 슈퍼에서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오렌지주스는 페트병에 담기게 되었다. 유리병보다 페트병이 가볍고 덜 깨지니까.
따봉이 부른 오렌지 전쟁
델몬트 VS 썬키스트

해태가 하면 롯데도 한다. 해태의 ‘썬키스트 훼미리 쥬스’가 세상에 나오자, 다음 해인 1983년 롯데는 ‘델몬트’ 상표와 기술을 받아 오렌지주스를 판매한다. 두 업체의 전쟁으로 주스시장은 나날이 커져 짧은 시간 내에 콜라와 사이다 시장을 추월한다.
썬키스트와 델몬트는 국내 오렌지주스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썬키스트가 항상 높았다. 델몬트는 업계 1위인 썬키스트를 잡기 위해 한국 광고계에 길이 남을 유행어를 만들어낸다. 바로 “브라질에서는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이 썰렁한 유행어가 만든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많은 사람들이 슈퍼나 마트, 백화점에서 따봉이라는 오렌지주스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따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렌지주스는 없다는 것. 결국 따봉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썬키스트를 사게 되는 웃픈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재미있는 광고가 꼭 매출에 도움은 안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마시즘은 아니다. 아닐 거야.
그런데 감귤은요?
오렌지주스가 잘 될수록 감귤이 잘 팔린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오렌지주스가 이토록 승승장구하는 동안 우리의 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오렌지의 인기에 농부들이 귤나무를 들고 일어서지 않았을까?
아니다. 오렌지주스가 잘 팔릴수록 감귤농사도 이익을 봤다. 이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오렌지 농축액에 쿼터를 두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장벽은 만만치 않았다. 정부는 매년 제한된 양의 오렌지 농축액을 수입했고, 국내산 감귤을 구매한 음료회사에게 (감귤 구매 대비로) 오렌지 농축액 구매를 배정했다.
이러자 해태와 롯데는 장외경기로 감귤 확보 전쟁을 해야 했다. 1989년에 감귤농사가 흉년이 들자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까지도 모두 음료회사들이 구매할 정도였다. 이토록 많이 구매한 감귤들은 역시 주스가 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입에 들어간 것이다(물론 맛있었다).
브랜드의 인기를 넘어
오렌지주스가 생활이 될 때까지
썬키스트와 델몬트 2강 체제는 97년에 들어 급격히 무너진다. 먼저 오렌지 원액 수입을 완전 자유화로 풀었기 때문에 감귤을 사지 않아도 오렌지 농축액을 구입할 수 있었다. 썬업, 자연은, 아침에 주스 등의 후발주자들이 생겨났다. 또한 오렌지주스의 기준이 고온살균에서 저온살균으로, 농축에서 비농축으로 바뀌며 영원할 줄 알았던 썬키스트와 델몬트의 산맥이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오렌지주스는 어떤 브랜드의 생명에 의지하지 않고 대중들의 식습관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보다 상큼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음료로 주스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사랑받지 않을까?